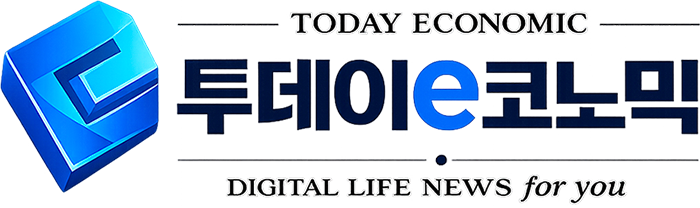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지난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로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중앙디성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한 1만305명이었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가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앙디성센터가 출범한 2018년 이래 처음이다.
이들을 위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도 전년 24만5000여건에서 30만여건으로 22.3% 늘며,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25.9%는 성명이나 연령,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다. 지난해 개인정보 동반 유출 건수는 7만7652건으로, 전년(5만7082건)보다 2만건 넘게 증가했다.
진흥원은 오는 17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해져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72.1%, 남성은 27.9%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50.9%로 과반을 차지했고, 10대(27.8%), 30대(12.9%), 40대(4.4%), 50대(2.5%), 10대 미만(0.1%)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가 전체 피해자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중앙 디성센터에 접수된 피해 지원 신청(1만683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2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24.9%), 유포(17.2%), 유포협박(13.3%),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별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227.2%나 급증했다.
성별에 따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포 불안이, 남성은 불법촬영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는 채팅 상대나 일회성 만남과 같은 '일시적 관계'가 28.9%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26.5%), '관계 미상'(24.7%), '사회적 관계'(10.0%), '친밀한 관계'(9.7%), '가족관계'(0.2%) 순이었다.
최초 상담 경로의 약 3분의 2는 전화 상담이었고, 나머지는 온라인 게시판 등이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가 43.0%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39.0%), SNS(10.7%), 클라우드(3.3%) 순이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중앙디성센터가 수집한 2만6천318개 사이트 가운데 95.4%는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였다. 이 중 미국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범죄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딥페이크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알려주고, 학원폭력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 는 사안임을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면 누구와 의논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도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면 거기서 신고도 대신해 주 고 심리상담도 해준다"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피해자가 됐을 때 해결 방법 등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